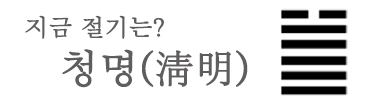『사람은 왜 아플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이당 작성일17-06-25 19:03 조회5,4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껴안을 것인가
풍부한 과학적 사례와 역사, 철학, 문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아픈 존재”로서의 인간을 탐사하다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병(炳)’, 어떻게 볼 것인가
아픔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
흔히 ‘아프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의 반대로 여겨진다. 정말 그럴까. 아픔을 건강의 반대편에 놓을 때, 그것은 몸과 마음을 주저앉히고 삶의 모든 활력을 앗아가는 부정적인 상태에만 머물게 된다. 하지만 아픔을 살아 있음의 증거로 바라볼 때, 아픔은 “나를 되찾는 건강 상태”가 될 수 있다. 사람에 대해 묻고 탐구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사람은 왜] 다섯 번째 권 <사람은 왜 아플까>는 아픔 그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질문을 던지고, 아픈 존재로서의 인간을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 신근영은 아픔을 건강의 대척점으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아픈 몸과 마음을 우리 관심의 한복판으로 가져와 ‘또 다른 건강’으로 아픔을 성찰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살펴보게 될 아픔은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하는 아픔이고, 나라는 존재를 내게 돌려주는 아픔이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건강은 자기 망각이라는 놀라움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아픔은 그 자기 망각이 깨지는 때입니다. 아픔이 찾아와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건강이 갖는 아이러니, 아픔이 갖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작 건강할 때는 잊고 사는 ‘나’라는 존재를 내게 돌려주는 것은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어떤 면에서 나를 잃어버린 아픈 상태이고, 아픔은 나를 되찾는 건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들어가며> 중에서
질병은 어떻게 까다로운 자연 선택의 시험대를 통과했을까?
우리는 진화가 덜 된 것일까?
“생존에 적합한 것들은 남기고 해로운 것들은 털어 내는 진화의 과정에서 질병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저자는 이 수수께끼의 단서를 판다의 엄지손가락과 우편배달부 슈발의 건축물에서 찾는다. 판다의 엄지손가락은 누가 봐도 혹처럼 불룩 튀어나온 결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손목뼈가 임시변통으로 진화한 것으로, 대나무만 먹도록 적응해 온 판다에게는 생존을 위한 훌륭한 장치이다. 한편, 슈발의 ‘아방궁’은 피카소도 감탄을 금치 못했을 정도로 동서양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구현된 웅장한 예술 작품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편배달부인 슈발이 편지를 배달하면서 길에서 주운 돌들을 그때그때 쌓아 만든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판다의 엄지손가락처럼 ‘진화’란 임시방편의 과정이며, 슈발의 작품처럼 ‘생명’은 설계도 없이 시작된 브리콜라주다. 여기에 질병이 진화의 시험대를 통과한 비밀이 있다. 만약 생명이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되었을까? 저자는 답한다. “그 시나리오에는 질병도 없지만, 생명체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라거나 흠이 없는 상태는 진화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갈 아무런 잠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진화의 시간 속에서 질병은 생명의 역사가 가진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적응하며 변화했기에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적응과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란 언제나 어설픈 땜장이 몸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 <생명과 아픔> 중에서
고통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 책은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생명과 아픔’을 시작으로, 몸, 사회, 마음 등 아픔의 여러 측면을 들여다본 뒤, 마지막 장에서는 “어떻게 아플 것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몸의 아픔을 다루는 2장에서는 미생물의 발견에서 미생물이 병원체로 지목되기까지의 과정이 펼쳐지는데, 특히 인류 문명의 역사를 미생물의 눈으로 기술한 대목이 흥미롭다.(<미생물들에 불어 닥친 혁명의 바람>) 3장 <사회와 아픔>에서는 제약 회사와 의사, 환자라는 트라이앵글이 우리 삶을 점점 더 의학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는 현실을 비판하는 한편, ‘위생의 시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면역 질환들을 살펴보며 우리 몸과 타자와의 관계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 문제는 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른다는 데서 생깁니다. (……) 우리는 타자와 깔끔한, 위생적 관계를 맺으려 듭니다. 타자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어벽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혼자라는 불안감,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 <사회와 아픔> 중에서
마음의 아픔을 다루는 4장에서는 감정 노동, 무통증 환자, 소시오패스, 가정 폭력, 의존증과 중독증, 뮌하우젠 증후군, 트라우마 등 다양한 정신적 증상 및 사회 현상을 사례로 가져와 “고통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간다. 저자는 일본의 심리상담사 신다 사요코가 만난 무통증 환자의 예에서 고통의 능동적 기능을 발견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 또한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흔히 고통 없는 세상을 유토피아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알려 주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무통증은 이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우리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타자와의 삶 역시 위태롭게 합니다. 그렇기에 고통 없는 세상은 곧, 고통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일 것입니다. - <마음과 아픔> 중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아픈가
우리 삶은 어떻게 아픔과 이어져 있는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은 네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한 세기를 살다 간 독일 철학자 한스 가다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하이쿠’를 정립하여 일본 근대 운문 문학의 새 길을 연 마사오카 시키, 20세기 최고의 사상가라 일컫는 이반 일리히가 그들이다. 국적도, 살아간 시대도, 몸담은 분야도 다른 이 네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모두 심각한 신체적 고통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가다머는 20대 초반 앓은 소아마비로 평생 다리와 척추 통증을 곁에 두고 살았으며(<한스 가다머, 고통이라는 질문>), 졸리는 자신에게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다.(<안젤리나 졸리, 고통, 그리고 두려움>) 시키는 결핵으로 척추가 완전히 망가져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죽을 때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병상에서 지냈다.(<마사오카 시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예쁜 것은 예쁜 것이다>) 마지막 인물 일리히는 뺨에 생긴 암 덩어리가 점점 커져 가며 말하고 듣는 데에 문제가 생겼을 뿐 아니라 평생 극심한 통증을 겪어야 했다.
네 인물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아픔을 겪어 나갔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품었는지, 또 어떻게 질문을 던졌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책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의 지점까지 독자를 이끈다. 고통의 문제와 맞닥뜨린 네 인물의 사례를 통해 독자들은 ‘아픈 존재’로서의 사람을 사유하고, 다른 고통, 다른 죽음을 상상하고,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건강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그럼에도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화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리히는 현대 의학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오, 사양하겠습니다!” - <이반 일리히, 고통조차 삶이 되는 길> 중에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